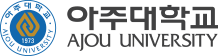-
-
3810
- 작성자손예영
- 작성일2026-02-12
- 415
- 동영상동영상
-
-
3808
- 작성자손예영
- 작성일2026-02-11
- 1291
- 동영상동영상
-
-
3806
- 작성자손예영
- 작성일2026-02-10
- 694
- 동영상동영상
-
우리 학교 약학과 ‘생물의약품연구실’과 화학과 ‘전기분석화학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각각 재인증 및 신규 연구실로 선정됐다.‘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우수한 안전관리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중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인증패 수여식은 지난 6일 율곡관에서 진행됐으며, 한호 교무부총장과 한지형 총무처장, 진효언 교수(약학과), 유충열 교수(화학과)를 비롯한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호 교무부총장이 선정 연구실 책임교수에게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는 우리 학교 두 개 연구실을 포함해 ▲건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SK하이닉스 기반기술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실 총 92개 연구실이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안전환경 시스템 ▲활동 수준 ▲관계자 안전의식 3개 분야다. 이 중 총 27개 항목, 108개 세부 심사지표를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이 됐다.우리 학교 연구실 중 약학과 ‘생물의약품연구실’은 2023년도에 이어 2025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재인증 받았으며, 화학과 ‘전기분석화학실험실’은 신규 인증 연구실로 선정됐다. 두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교육 및 사고대비 훈련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약학과 ‘생물의약품연구실'에서는 기능성 바이오나노 소재를 발굴하여 바이오센서 및 표적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화학과 ‘전기분석화학실험실’에서는 전고체전지, 차세대 이차전지, 연료전지 등에 핵심 소재로 응용 가능한 고체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한편, 우리 학교 안전관리센터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컨설팅과 안전환경 개선 활동 · 안전용품 지급 등을 지원했다. 또한 안전관리센터는 연구실 안전 공모전, 연구실 안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3804
- 작성자조혜윤
- 작성일2026-02-10
- 899
- 동영상동영상
-
-
3802
- 작성자홍보실
- 작성일2026-02-10
- 808
- 동영상동영상
-
-
3800
- 작성자홍보실
- 작성일2026-02-09
- 1409
- 동영상동영상
-
-
3798
- 작성자홍보실
- 작성일2026-02-06
- 941
- 동영상동영상
-
-
3796
- 작성자손예영
- 작성일2026-02-05
- 1087
- 동영상동영상
-
아주대학교 제18대 총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기주 총장이 2월 1일부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4년간 학교 발전을 이끌어 온 최 총장은 구성원들의 신뢰 속에 연임에 성공하며 앞으로의 4년을 다시 한번 책임지게 됐다.아주대학교는 형식적인 취임식 대신 ‘미래비전 공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새 임기의 출발을 알렸다. 행사는 2월 3일 오후 교내에서 열렸으며, 교내외 주요 인사와 학생,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면서도 의미 있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취임 기념 행사가 아니라, 최 총장이 준비한 대학의 중장기 비전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축사에 앞서 아주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소개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비전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담긴 ‘내가 바라는 아주대’ 영상이 공개되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행사의 중심 순서인 최기주 총장의 비전 발표에서는 ▲AI 시대 대응 교육혁신 ▲융합 연구와 대형 과제 확대 ▲의과대학·병원 중심 성장 전략 ▲지역사회 연계와 글로벌 도약을 큰 골자로 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제시됐다.최 총장은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간 중심 AI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 학과 신설과 융합 전공 확대를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융합 연구 활성화와 대형 연구과제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콰트로 정밀학 연구원과 부처 협업형 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학문 간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의과대학과 병원을 대학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비전도 강조됐다. 병원 매출 1조 클럽 달성과 경기 남부 의료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 의료·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개방형 캠퍼스 조성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화 지표를 강화해 아주대학교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됐다.최 총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비전은 세우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교수와 학생, 직원, 재단과 동문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비전공유회에서는 여러 주요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제18대 최기주 총장의 연임을 축하하고, 아주비전 5.0을 통한 교육 혁신과 첨단학과 신설, 융합교육 강화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아주대학교가 앞으로 교육혁신의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준혁 국회의원은 아주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그동안 아주대 발전을 위해 기울여 온 많은 노력이 앞으로 더 큰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중원 아주대학교 총동문회장은 후배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지식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행사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수원시립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아주대학교 교가를 제창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구성원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진행된 이번 비전공유회는 아주대학교가 앞으로 펼쳐 갈 4년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미래비전 공유회 행사 전경△ (사진 좌측부터) 축사하는 김준혁 국회의원, 최중원 총동문회장△ 비전 발표하는 아주대 최기주 총장△ 주요 관계자 단체사진
-
3794
- 작성자홍보실
- 작성일2026-02-04
- 3256
- 동영상동영상
-
아주대학교 반도체 분야 지산학 협력 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학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체-대학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고라(AGORA)센터 첨단반도체응용 Lab’은 30일 참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책임 교수를 맡은 우리 학교 오일권 교수(지능형반도체공학과)와 씨앤원, KETI, MKP, ATIK, ACS, FNS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의체 출범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아고라(AGORA)센터 첨단반도체응용 Lab 및 지산학협력협의체 소개 ▲협의체 발대 선언 ▲운영체계 및 추진 방향 공유 ▲소자·공정·설계·AI·빅데이터·인력양성·사업화 등 분야별 협력 방안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주대학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지난해부터 참여하면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자체-기업-대학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 내 미래 성장 산업과 지역 기반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 등도 이 사업의 주요 과제다. RISE 사업은 5년 동안 매년 40억원씩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정부지원사업으로, 아주대학교는 미래성장산업 선도형에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는 지산학 협력 혁신센터 ‘아고라(AGORA) 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고라(AGORA, Ajou Gyeonggi Open Research Alliance) 센터는 지산학 협력을 위한 소통 조직으로, 관련 산업체와 지자체 등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아주대 아고라 센터 내에는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의 주요 분야 별로 아고라 랩(Lab) 8개가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아고라 랩(Lab) 내에는 지역과 산업계 및 연구기관, 대학을 연결하기 위한 소통 기관으로 지산학협력협의체를 두고 있다. 발대식을 통해 본격 출범한 아고라(AGORA)센터 첨단반도체응용 Lab 지산학협력협의체는 앞으로 반도체 소자·공정·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AI·빅데이터, 통신, 모빌리티 등 융합 분야와 연계한 현장 수요 기반 공동 연구와 기술이전, 인력양성 및 사업화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과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의체의 회장을 맡은 오일권 교수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학과 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긴밀히 연계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라며 “반도체 분야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고라(AGORA)센터 첨단반도체응용 Lab은 앞으로 기술교류회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RISE 사업과 연계한 지산학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3792
- 작성자손예영
- 작성일2026-02-02
- 1581
- 동영상동영상
-
-
3790
- 작성자손예영
- 작성일2026-01-30
- 1582
- 동영상동영상
-
-
3788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26-01-29
- 1413
- 동영상동영상